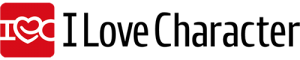사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주식회사 A는 캐릭터 ‘다니’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돌아온 다니’를 만들어 C방송국에서 방영했다. 당시 애니메이션 제작 감독은 B였다. D는 캐릭터 기반 머천다이징 사업자다. 캐릭터 ‘다니’가 마음에 들어 A제작사에 라이선싱을 제안하려 했지만 10년 전에 폐업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해산 간주 등기가 된 상태란 걸 알았다. A제작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 연락을 시도했지만 폐문 부재로 반송됐다.
그래서 D는 C방송국에 ‘돌아온 다니’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라이선스 사업을 허락할 수 있는지 물었다. C방송사는 저작재산권자가 아니고 방송 사업자로서의 지위만 있다면서 A제작사 및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고 캐릭터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허락 없이 ‘다니’캐릭터 머천다이징 사업을 진행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D는 애니메이션 제작 감독 B를 만나 저작권 귀속을 문의했다. B는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저작권이 누구에게 양도되거나 귀속됐는지 알 수 없지만 A제작사는 이미 폐업했고 C방송사는 방송만 했을 뿐 저작권이 없으므로 자신과 계약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D는 합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률 사무소 문을 두드렸다.
위 사례에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방송사 및 감독의 주장은 어디까지 맞는 걸까? 그리고 D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설
A제작사 해산 시 업무상 저작물 권리 귀속
A제작사가 기획·제작한 애니메이션 ‘돌아온 다니’는 제작사 명의로 방송을 통해 공표됐으므로 업무 저작물로서의 저작자는 A제작사가 된다. 주식회사가 폐업하거나 해산하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 등기가 되거나 청산 간주 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산 간주 등기만 된 상태라면 여전히 애니메이션 저작권은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법인의 허락을 얻어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주식회사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청산 절차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 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하며(상법 제538조) 청산 절차 종결 후 청산 등기를 한다. 해산 등기 후 청산 등기 이전이라면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법인 재산이므로 법인이 그대로 보유한 상태이거나,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 재산으로 남았다면 주주에게 주식 보유 비율대로 권리가 귀속돼 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는 저작물이 된다.
위 사례에서‘돌아온 다니’의 저작권은 A제작사 또는 주주들에게 귀속된 상태이므로 D는 A제작사 또는 A가 청산 후 잔여 재산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잔존한 상태로서 주주들에게 잔여 재산으로 분배된 경우라면 주주들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작사가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라면, 해산한 법인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고 지정한 자가 없다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양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 없이 법인이 청산돼 법인격이 소멸됐다면 국가에 권리가 귀속돼 저작권이 소멸하게 된다(민법 제80조 제3항, 저작권법 제49조 제2호 참조).
애니메이션에 대한 C방송사의 권리
C방송사는 애니메이션을 방송했지만 창작에 전혀 관여한바 없으므로 저작자의 지위가 없어 저작재산권을 전혀 갖지 못한다. 따라서 D가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복제·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함에 있어 C방송사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해야 할 이유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C방송사는 저작권법상 애니메이션에 대해 방송사업자로서 저작인접권(복제, 동시 중계방송, 공연)을 가진다. 그러므로 D가 애니메이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동시 중계방송, 공연 등 저작인접권 행사의 방법으로 이용하려면 C방송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D가 애니메이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니’ 캐릭터만의 상품화 사업을 위해서 복제·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C방송사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위 사례에서 C방송사의 경고는 D가 애니메이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동시 중계방송, 공연의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애니메이션 제작 감독 B의 권리애니메이션 제작 감독을 맡은 B는 A제작사와 체결한 계약 관계에 기초한 채권적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접권을 갖지는 않는다.
B가 A제작사와 계약에 의해 애니메이션 저작권에 대한 지분을 양도받은 게 아니라면, B는 감독의 지위로 D에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도 실연자에 포함돼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지만, 애니메이션이라는 저작물에 대한 실연을 감독한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제작을 감독한 B는 실연자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저작인접권도 없다.
위 사례에서 D는 B에게 저작권자인 A제작사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계약서 등의 권리를 증빙할 것을 요구해 확인받지 않고 B의 말만 믿고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법정이용허락 제도의 활용
위 사례처럼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다면 저작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법정이용허락 제도가 있다(저작권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다만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선 위 사례 정도로는 부족하고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법률고문변호사
·(사)한국MCN협회 법률자문위원
전화: 02-6952-2616
홈페이지: http://dkl.partners
이메일: dan.kwon@dkl.partners
아이러브캐릭터 / 권단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저작권자ⓒ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