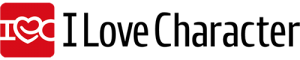유아기부터 유튜브로 뽀로로를 보며 자라난 아이들,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디지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은 버튼을 배우기보다 화면을 탐색하며 이해했고, 검색을 통해 질문하는 법을, 댓글을 통해 반응하는 법을 배웠다. 아날로그 세대가 적응 과정을 거쳐 익힌 기술을 이 세대는 본능처럼 체화하며 성장했다. 우리는 그들이 스마트폰을 장난감처럼 다루던 어제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막 성장하는 세대는 웹툰을 만들고 쇼트폼을 편집하며 AI를 자연스럽게 자기표현의 도구이자 창작의 언어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에 대한 익숙함이 곧 창의력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툴은 능숙하지만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결과는 빠르지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돌아보지 못한다.
따라서 오늘날 교육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핵심은 AI도구의 사용법이 아니라 자기 설계력(self-design power)이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분석하며 감정을 구조화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힘. AI 시대의 진짜 창작 교육은 툴을 빠르게 다루는 능력이 아니라 툴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구현하는 능력을 키워 주는 일이다. 이것은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문해력(new literacy)이다.
툴보다 먼저 필요한 질문
요즘 강연이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AI 툴을 배우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학원에 다니면 AI 웹툰을 만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툴이 아니라 태도다. AI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무엇을 왜 만들 것인지는 끝내 사람이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AI로 하루 만에 쇼트폼을 만든대”라고 한다면 그 말은 사실일 거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하루 동안 무엇을 만들 것인지 충분히 고민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창작자의 의도에 부합했는가?”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어떤 감정으로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창작의 출발점이다. 도구는 실행의 수단일 뿐 의도의 방향을 세우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반드시 공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창작물은 단순히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작품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마음에 가 닿고 감정을 흔들 때 비로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AI가 만들어주는 이미지는 빠르고 멋질 수 있지만 깊은 고민 없이 생성된 결과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설령 우연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다 해도 그것이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울림을 다시 재현할 수 없다.
AI는 누구에게나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작가가 전달하려는 감정과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건 단지 생성된 결과물일 뿐 창작된 작품은 아니다. 진짜 창작자는 AI가 만들어준 결과가 자신의 의도와 감정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사람이다. 즉 무엇을 만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담고 있느냐다.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AI를 파트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감동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은 여전히 나의 질문과 의도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창작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다.
 |
| ▲ Prompt: Surrounded by multiple AI screens showing different versions of joy, sadness, love, and hope in the same scene, the creator of the cute girl wears a soft smile that symbolizes emotional literacy and intentional creation. The background is full of soft particles of light that represent the imagination. Semi-realistic illustrations, calm atmospheres, and storytelling composition |
AI와의 경쟁은 속도전이 아니다
AI는 이미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까지 편집한다.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멋진 이미지를 얻고 몇 초 만에 쇼트폼을 완성할 수 있는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다. 우리는 감정의 이유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AI는 감정을 그려낼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왜 그려야 하는지는 모른다. 창작의 본질은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장면이 존재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일이다.
예전에는 콘티 한 장을 수정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이제는 미드저니나 소라가 몇 초 만에 완성된 컷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림이 예쁜가가 아니라 이 장면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감정의 이유를 갖고 있는가다. 같은 눈물 한 방울이라도 AI는 물리적으로 흐르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눈물이 왜 흘러야 하는지, 누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설계하고 표현해 내는 건 작가의 몫이다. 누가 주인공인지,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지, 관객이 어디서 웃고 어디서 울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장면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다.
AI와 인간의 차이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다. AI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지만 그 결과에 이유와 감정의 구조를 부여하는 사람은 작가다. AI와의 경쟁은 누가 더 빨리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이해하고 제대로 설계하는가일 것이다.
AI 시대의 네 가지 창작 능력
도구보다 중요한 건 창작자의 감각,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보다 중요한 건 왜 만들고 싶은가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AI는 인간의 창의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증폭시키기 위한 거울이 된다. 그 거울 앞에서 진짜 창작자는 다음 네 가지 능력을 길러야 한다.
1) 목표를 세우는 능력: 방향을 잃지 않는 질문
AI는 무엇을 잘 만드는 도구지만 왜 만드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가? 어떤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가? 창작의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의도의 명확함이다. AI가 제시하는 수많은 결과물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다.
●실전 팁 목표 설정형 프롬프트 뽑아보기
|
2)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작의 사고력
창작은 늘 문제의 연속이다. 왜 이 장면이 밋밋하지? 주인공의 감정선이 왜 끊길까? 3초 안에 시선을 못 끄는 이유는 뭘까? AI는 이런 질문에 도구적 답은 제시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건 우리의 감각이다. 창작자의 진짜 역량은 무엇을 만드는가보다 무엇이 잘 안되는가를 스스로 찾아내는 힘에 있다.
●실전 팁 하나의 쇼트폼을 만들 때
|
3) 결과를 선택하고 선별하는 감각: 감정의 문해력
AI는 수백 장의 이미지를 뽑아주지만 그중 한 컷을 선택하는 건 우리의 취향과 감각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는 지겨울 만큼 언급했다. 심미안과 편집 감각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문해력이다. 예쁜 컷을 고르는 사람은 많지만 이 장면이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감정을 전달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드물다. AI가 준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 결과를 편집하여 의미를 만드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전문가의 경계선이다.
●실전 팁
소라가 만든 영상에서 5초 단위로 감정 리듬을 분석하여 필요한 컷들만 잘라 써보라. 시각적으로 예쁜 컷과 정서적으로 필요한 컷은 분명 다르다.
|
4) 의도, 꾸준함, 향상심: 태도의 지속성
AI를 오래 쓰는 사람일수록 결과보다 과정의 질을 본다. AI가 빠르다고 해서 나의 방향까지 대신 정해 주진 않는다. 꾸준히 의도적으로,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진정한 창작자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될 것이다. 창작은 단 한 번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실험의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실전 팁 하루 한 번, 같은 주제를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보라.
|
우리는 기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AI는 손과 눈을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생각과 감정의 이유만큼은 인간만이 설계할 수 있다. 그 네 가지 능력이야말로 AI 시대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창작자의 핵심 역량이다.
“학원에 가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아닐 것이다. 학원은 남이 만든 문제를 푸는 곳이다. 하지만 창작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장면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이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창작이 시작된다. AI는 그런 욕구를 실현하도록 돕는 손일 뿐 당신 대신 방향을 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학원을 가야 한다면, 도구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배움의 방법을 익히기 위해 가야 한다. AI 시대의 학습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보는 경험을 쌓는 과정이어야 한다. 즉 학원에서 배워야 할 건 툴 사용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창작은 누가 알려주는 공식이 아니다. 자신의 의도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AI 시대의 진짜 수업은 교실 밖에서 이어진다. 배우는 장소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이다. 결국 필요한 건 자기 설계력 AI 시대의 창작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를 구조화하고 감정을 설계하며 도구를 활용해 자신만의 세계를 완성할 줄 아는 사람이다. AI는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힘은 오직 우리에게 있다. 나 자신을 설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AI를 잘 쓴다는 건, 나를 설계할 줄 안다는 말이다.
필요 항목 |
설 명 |
시도하기 |
목표 설정 |
내가 표현하고 싶은 세계를 정의 |
감정이 보이는 쇼트폼 만들기 |
문제 해결 |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 나누기 |
후킹-감정 전개-반전 구조 |
선택과 분별 |
AI 결과 중 의미 있는 것 고르기 |
예쁜 컷보다 감정이 맞는 컷 선택 |
꾸준함과 향상심 |
스스로 방향을 잃지 않는 태도 |
매일 한 장면씩 실험하기 |
교육자이자 부모로서의 제언
성인이나 학생이 AI 툴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건 버튼 누르는 법이 아니라 의도를 파악하는 습관이라고 말하고 싶다. 창작이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세상에 드러내 공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AI는 그 과정을 빠르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주진 못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AI가 아니라 너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이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창작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 문장이자 출발점이다. 이 글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메시지다.
AI 시대의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진화에서 시작된다. 도구는 계속 변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라. AI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학생들에게,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창작의 철학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김한재
·강동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교수
·애니메이션산업, 캐릭터산업, 만화산업 백서 집필진
·저서: 생성형 AI로 웹툰·만화 제작하기(2024) 외 3편
[저작권자ⓒ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