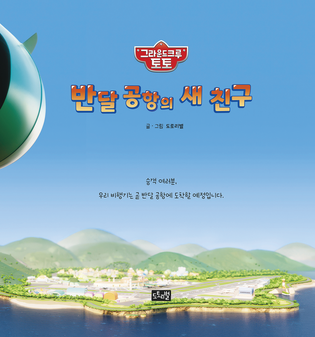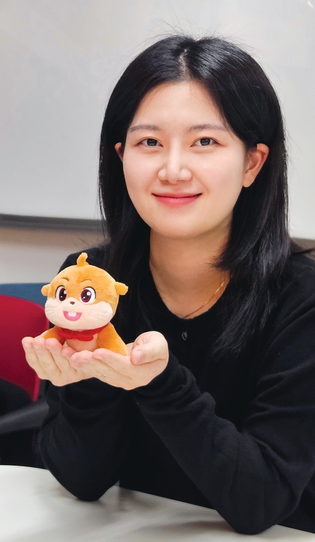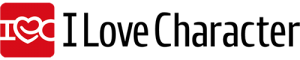아직도 AI 이미지를 두고 사람들은 종종 “딸깍”이라고 말한다. AI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클릭 한 번이면 그럴듯한 장면이 나오고, 몇 줄만 적어도 포스터 같은 비주얼이 튀어나오니 그런 표현이 생기는 것도 이해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잘 만든 프로젝트는 가까이서 볼수록(그리고 그 과정의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딸깍”이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결코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완성된 이미지가 주는 압도감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시간의 규칙 위에서 태어났는지 결과물 뒤편에서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밴디가 넷 작가의 기획 아래 시작된 오베르 프로젝트는 바로 그 규칙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오베르 5번째 프로젝트 전시의 제목은 ‘Prester John’s Diary’였다. 한 해의 날짜를 비우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365개의 작업으로 채운다는 발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시작해 보면 단순하지 않다. ’하루에 하나‘는 곧 ’1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AI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속도가 아니라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속도였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제작 시스템처럼 움직였다. 의외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은 자신이 맡기로 한 날짜를 앞에 두고 저도 모르게 그날을 오래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어떤 의미를 담을지, 그 날짜를 어떤 장면으로 남길지, 결과물보다 과정이 먼저 자신을 붙잡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루라는 단위가 작업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 무게가 작품의 결을 만들어냈다.
첫 오리엔테이션은 10월 중순 밤 9시에 줌으로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각자 날짜를 나누어 맡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달라”, “이미지는 2,000픽셀 이상”, “이미지 위 텍스트는 최소화하고 설명란을 활용하자”, “작품 설명은 100∼150자 정도가 좋겠다”등의 안내는 얼핏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디테일이 모여 작업의 톤을 정리한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마감 규칙이었다. 일정 시점까지 업로드되지 않으면 해당 날짜는 재배정되거나 대체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프로젝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공지는 처음부터 철저히 지켜졌다. 냉정해 보이지만 공동 프로젝트에서 가장 따뜻한 방식은 때론 명확함일 수 있다. 누군가의 사정이 다른 사람의 구멍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구멍을 시스템이 감당하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 그 명확함이 참여자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지나고 보니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다. 프로가 아니면 쉽게 만들기 어려운 진행의 결을 가까이에서 함께 겪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실을 깨닫는다. “이 AI 프로젝트는 명확하게 협업 툴 프로젝트다.” 노션으로 공지를 모으고, 구글 시트로 날짜와 진행을 점검하고, 피그마로 레이아웃을 확인하는 흐름은 스타트업 팀의 제작 파이프라인과 다르지 않았다.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빠르지만 이미지를 책으로 만들고 전시로 옮기는 속도는 여전히 사람이 만든다.

기획과 운영을 맡은 밴디가넷 작가는 빈 날짜가 생기면 그 구멍을 메우고, 출력과 편집을 고민하고, 포스터와 설명문을 정리하면서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성의 방향’으로 밀어붙였다. 동시에 참여자들은 각자의 날짜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의 시간을 써 내려갔다.
“AI가 다 해준다”는 말이 틀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AI는 생산을 돕지만 출판과 전시는 생산 이후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건너갈 수 없는 영역이다. 결과물은 기술로 만들 수 있어도, 결과물의 질서와 신뢰는 결국 사람의 손으로만 세워진다.
전시는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인근 큐브 갤러리에서 열렸다. 마지막 날은 파티로 마무리했다. 그 공간에서 관객이 마주한 건 단순히 AI로 만든 이미지가 아니었다. 각자의 날짜에 의미를 담아 제출한 작업들이 한 해의 흐름을 만들었고, 그 흐름이 다시 책(다이어리)으로 묶이며 물성을 얻었다.

전시장을 다녀온 사람들이 “다이어리가 소중하다”, “이 다이어리로 2026년을 기록하면 좋은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이미지가 볼거리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도구가 되는 순간이었다. 손에 잡히는 물성은 AI 이미지가 가볍다는 편견을 조용히 뒤집는 방식이기도 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전시가 감상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인들을 초대해 교류하자는 제안이 오갔고, 관객이 작가를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AI 시대에 창작자의 가치가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작품이 너무 쉽게 복제되고 너무 빨리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베르 프로젝트의 전시는 반대였다. 같은 화면을 보고도 사람들은 ‘이걸 작업한 사람’을 찾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돕는 방식’을 물었다. 기술이 창작자의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창작자가 설계한 경험이 기술 위에 올라탔을 때 오히려 창작자의 존재는 더 또렷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AI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도 결국 관객이 마지막에 기억하는 건 이미지의 생성 방식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끝까지 책임진 모든 이의 태도였다.
오베르 프로젝트를 따라가며 계속 떠오른 문장이 있다.
“마감은 창작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창작을 현실로 데려오는 문이다.”
AI가 등장한 뒤 우리는 아이디어를 더 많이, 더 쉽게 얻는다. 하지만 아이디어의 홍수는 종종 완성의 가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도구가 아니라 더 좋은 규칙과 더 단단한 약속과 더 잦은 만남이다. 날짜를 나누고, 파일 규격을 맞추고, 텍스트를 어디에 둘지 합의하고, 마감 이후엔 전시장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결국“딸깍”의 반대편에 있는 노동이자 창작을 지속시키는 기술이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느 때보다 사람 냄새나는 공간을 강하게 체감했던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다. 기술이 차갑다고 믿는 순간에도,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는 방식은 얼마든지 따뜻할 수 있다.
AI는 결과를 빠르게 만든다. 오베르 프로젝트는 그 빠름을 흩어지는 속도가 아니라 쌓이는 속도로 바꿔 놓았다. 365일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쌓인 신뢰의 단위였다. 우리가 AI 시대의 창작을 이야기할 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프롬프트가 아니라 우리다. 오베르 프로젝트는 그 단순한 사실을 하루씩 조용히 반복해서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그 증명은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AI 프로젝트가 참고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방향일지도 모른다.
Day Birth: 별·꽃·보석으로 하루를 정의하다
필자는 이번 전시에 ‘Day Birth’라는 제목의 작업에 참여했다. 이 제목에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 담겨 있다. ‘탄생일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지?’우리는 보통 생일을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특별한 날로 기억한다. 하지만 하루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사실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탄생에 가깝다. 그날의 감정, 관계, 선택, 방향은 전날과 다르고 그 다름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 이번 작업은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는 날을 그리고 싶었다. 이미지로 만드는 에세이라고 생각했다.
1. 콘셉트의 정의
‘Day Birth’는 각 날짜에 대응하는 별자리, 탄생화, 탄생석을 기준으로 구성됐다. 보석은 그날의 마음이 가진 단단함과 에너지를, 꽃은 감정이 피어나는 결과와 온도를, 별자리는 그 하루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기질을 상징한다. 이 세 가지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루를 설명하는 언어로 사용하고 싶었다. 그래서 날짜마다 그 의미와 분위기에 맞는 프롬프트 문장을 새로 구성했다. 중요했던 건 예쁜 이미지가 아니라 그날의 성격이 이미지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구조였으니까.
 |
| ▲ 프롬프트 a girl, glossy magazine beauty shot, Sapphirem, Libra, Chrysanthemum, skyblue background + sref |
2. 프롬프트의 구조와 Sref 선택
모든 이미지는 같은 포맷 안에서 생성했다. 날짜별로 달라지는 것은 상징 요소(별·꽃·보석), 그날에 부여된 의미문장, 감정의 톤과 무드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Sref(Style Reference)를 시도했고, 그중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의 결이 잘 유지되는 하나의 Sref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매우 중요했다. 같은 세계관 안에서 생성된 이미지들이 각기 다른 날이면서도 하나의 다이어리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스타일의 일관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Sref를 기준으로 모든 날짜를 같은 포맷, 같은 호흡으로 생성했다. 이 과정은 마치 각기 다른 하루를 같은 노트에 적어 내려가는 일과 같았다. 정말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3.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완성한 이미지는 클링(Kling)을 통해 영상으로 변신했다. 각 이미지의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짧은 영상들을 생성했고, 수노(Suno)로 이미지와 영상이 가진 분위기에 맞춰 가사와 음악을 생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사운드와 영상은 캡컷(Capcut)을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 하루가 하루로 끊어지지 않고 서서히 다음 날로 넘어가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시간을 가진 기록으로 바꾸는 과정처럼.
 |
▲ ·Prester John’s Diary by Auvers 앵콜전: “The Birth of Light, The Beginning of a Day” ·참여작가: Hanjae elly Kim, Valuename |
이 작업은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싶었다. 별이 떨어진 날은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기억하기로 선택한 날이라고 한다. 누군가에게는 생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날일지라도, 그 하루에는 분명 보석 같은 마음과 피어났던 감정과 향하던 방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담았다.
이렇게 이 작업이 전시장을 나선 뒤에도 각자의 하루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역시 누군가에게는 탄생일이고 의미 있는 날이니까. 그게 하루를 다시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김한재
·강동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교수
·애니메이션산업, 캐릭터산업, 만화산업 백서 집필진
·저서: 생성형 AI로 웹툰·만화 제작하기(2024) 외 3편
[저작권자ⓒ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