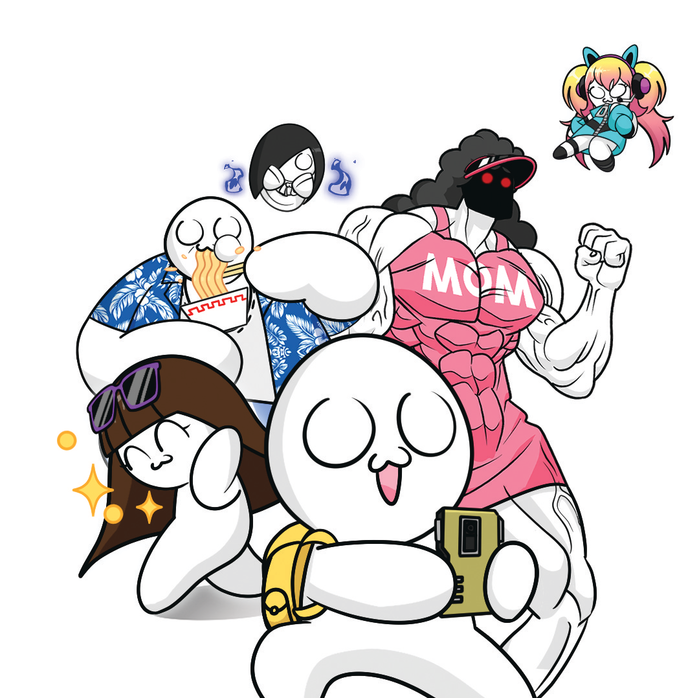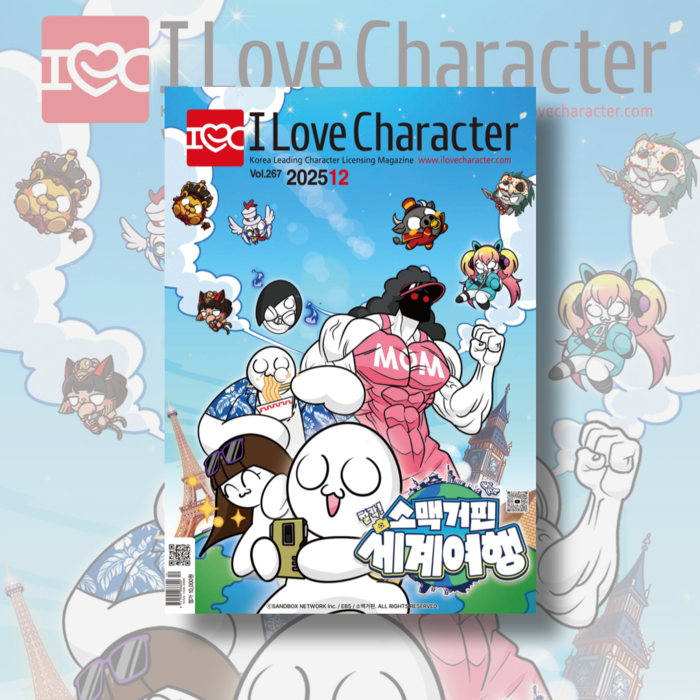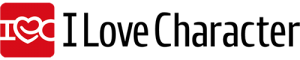캐릭터 저작권자의 영상화 허락에 대한 효력 기한
캐릭터가 인기를 얻으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캐릭터 저작권자에게 애니메이션 제작을 제안하게 된다.
이럴 때 보통 저작권자는 제작사와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허락하는 계약을 맺거나 애니메이션 제작 권리를 넘겨주는 계약을 맺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제작사와 캐릭터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낫다.
이때 저작권자가 별다른 특약 없이 이용을 허락했다면 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캐릭터를 이용해 다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저작권법 제99조 제2항 참조). 하지만 특약을 통해 계약기간 중에도 제3자에게 애니메이션 제작을 허락할 수있으며, 반대로 이를 금지하고 독점적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캐릭터의 애니메이션화 허락의 권리 범위
저작권자가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작사가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제작사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이 없을 때 캐릭터를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캐릭터를 이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갖게 되는데 해당 애니메이션을 방영 · 배포 · 전송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캐릭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는 제작사에게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허락했을 뿐이다. 때문에 저작권자가 애니메이션을 방송 · 복제 · 배포 · 전송할 때 캐릭터가 동시에 수반되는 것을 특약으로 허락하지 않았다면 제작사는 캐릭터가 포함된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제작사가 해당 애니메이션을 제작 취지에 맞게 방영 · 전송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한 문화산업의 발전이란 저작권법의 취지와 배치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이 같은 불편을 막기 위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을 통해 캐릭터 등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저 작권법 제99조 제1항).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원저작물을 각색 하는 것,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 하는 것,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 · 배포하는 것,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도 원저작권자가 영상화와 함께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캐릭터 저작권자가 제작사에게 애니메이션 제작만을 허락했다고 해도 제작사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애니메이션을 그 목적에 맞게 복제 · 배포 · 전송 · 방송 · 공개상영 · 자막을 입혀 이용할 권리를 허락받은 것으로 볼 수있다.
애니메이션 제작 협력을 약정한 사람과 제작사와의 권리관계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캐릭터뿐 아니라 음악, 각본, 컴퓨터그래픽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창작하는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은 창작과 동시에 그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원칙적으로는 제작사가 이들 개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면 좋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창작자들은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니라 대부분 용역계약 형태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제작사는 애니메이션을 복제 · 방송 · 배포 · 전송할 때마다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들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이라는 저작물을 소비자들이 감상하기가 어렵게 돼 문화산업 발전이란 저작권법 목적에 위배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이런 경우도 대비해 영상제작자는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복제 · 배포 · 공개상영 · 방송 · 전송 ·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창작자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0 조 제1항)
때문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는 애니메이션을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때마다 영상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이 같은 추정 조항으로 영상저작물 제작 협력을 약정해 개별적으로 얻은 저작재산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영상제작에 참여해 주인공 캐릭터의 새롭고 창의적인 포즈 모양이나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별도의 저작재산권을 가진 디자이너가 있다면 제작사는 이를 활용할 때마다 디자이너에게 이용을 허락받아야 한다. 이는 음악저작물, 각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결국 제작사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에 참여하는 창작자들과 관련 특약을 협의해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협력한 성우나 가수 등 실연자가 있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이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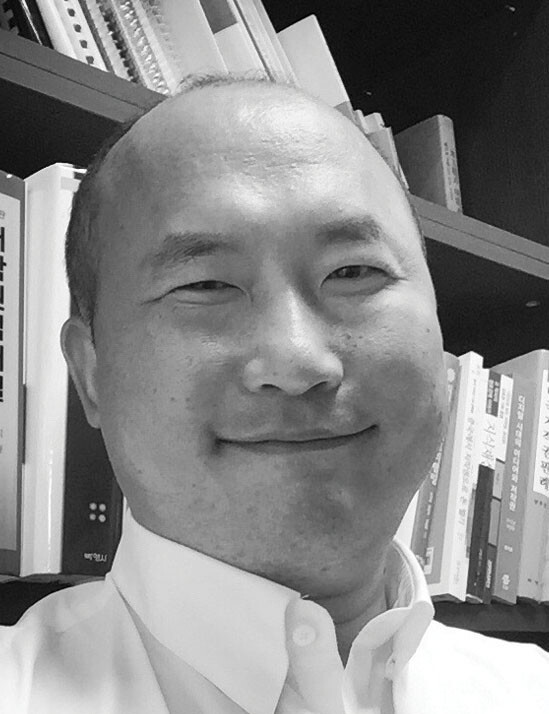
권단(변호사 · 변리사)
·법무법인(유)한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및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지식재산 MBA 겸임교수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전 화 : 02-6255-7788
블로그 : http://danipent.com
이메일 : dank@hanbl.co.kr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0.8월호
출처 :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저작권자ⓒ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