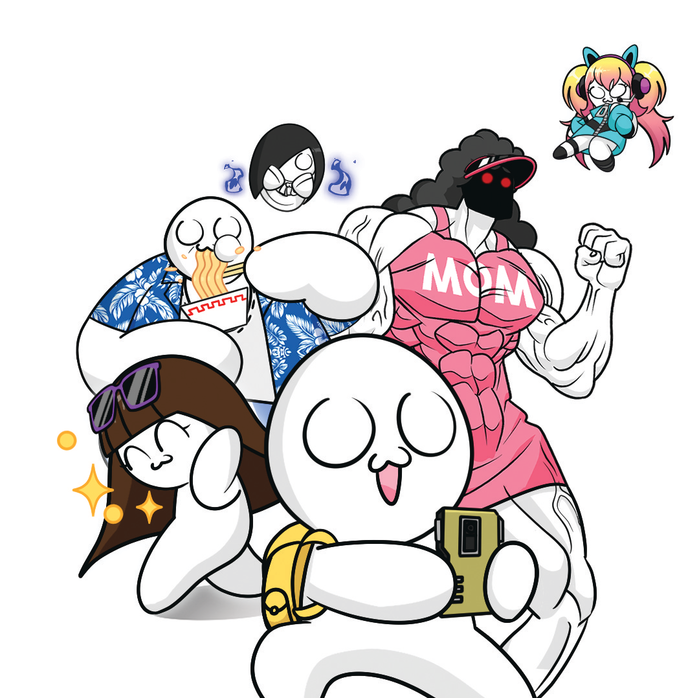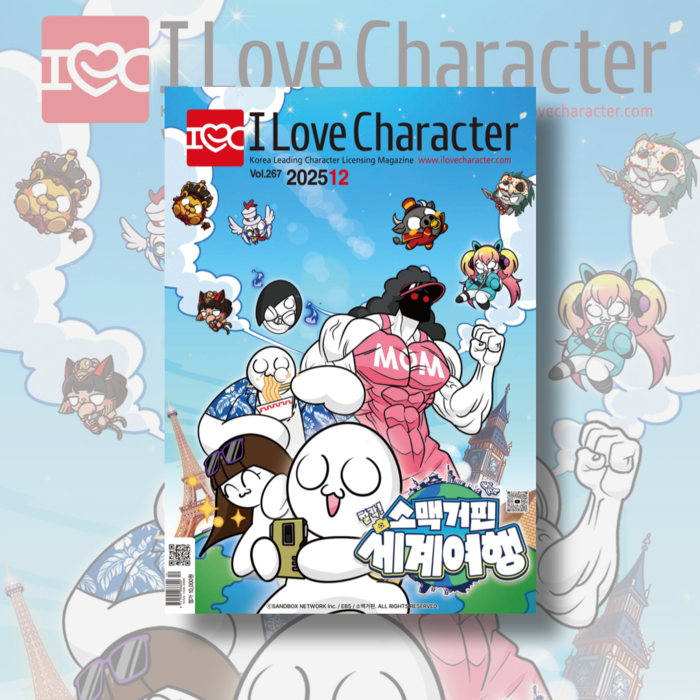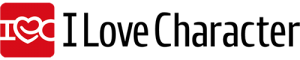사례
캐릭터 디자이너 권단은 아기곰 캐릭터 ‘다니’ 와 아기호랑이 캐릭터 ‘호니’ 를 창작해 각각 봉제인형과 SNS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권 작가는 다니 봉제인형을 중국 제조사에게 1개당 3,000 원을 주고 500개를 만들어 국내에 들여와 현재까지 1개당 1만 원을 받고 100개를 팔았다. 호니 이모티콘은 1개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봉제인형을 만드는 A사가 작가의 허락 없이 다니 인형을 다른 중국 제조사에게 1개당 1,000원을 주고 1만 1,000개를 만들어 들여와 1개당 3,000원에 1만 개를 팔아치웠고 나머지 1,000개는 창고에 보관 중이다.
그리고 캐릭터 디자이너인 B 작가는 호니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SNS 이모티콘을 만들어 1개당 1,000원씩 총 1,000개를 팔았다.
이에 캐릭터 저작권자인 권 작가는 자신의 허락 없이 인형과 이모티콘을 무단으로 제작,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한 A 사와 B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럴때 권 작가는 손해액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설명을 위해 사안을 단순화해 예시로 작성했다).
해설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A사와 B 작가는 권 작가의 저작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이로 인해 권 작가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이 사례에서 A사가 판매한 수량은 1만 개다. 만약 권 작가가 1,000개를 다 팔 수 있었다면 1,000만 원(1개당 1만 원×1,000개)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권 작가가 만들어 들여온 인형은 500개, 팔고 남은 재고가 400개뿐이었으므로 A사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권 작가가 1,000개를 팔 수는 없었다. 재고로 남은 400개를 다 팔아도 400만 원만 더 벌 수 있었다.
그리고 권 작가가 1,000개를 만들어 모두 팔았다고 해도 1,000만 원의 매출액에서 중국 제조사에게 수입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300만 원을 빼면 실질이익은 700만 원이다. 또 실제로는 500개만 팔 수 있었으므로 이를 다 팔았다고 해도 수입원가를 빼면 실질이익은 350만 원(전체 판매 가능 수량 500개×1개당 이익금액 7,000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A사의 판매가격이 1/3 수준으로 낮아 A사 인형이더 많이 팔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권 작가가 판매하는 인형이 1개당 1만 원에 100개 이상 더 팔렸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권작가가 A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최대 280만 원 (재고 수량 400개×1개당 이익금액 7,000원)이 한도다.
반면 A사는 3,000만 원의 매출(1개당 3,000원×1만 개판매)을 올렸고 실질이익은 2,000만 원(1만 개×1개당 이익)을 얻었으므로 권 작가에게 손해액으로 배상할 280만 원(이것도 최대로 인정할 경우의 금액)을 공제해도 1,720 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
호니 이모티콘의 경우 B 작가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권작가가 책정한 2,000원에 얼마나 팔렸을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
결국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법리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인과관계의 입증, 차액에 해당하는 실질이익 계산 방식, 권리자의 제품 생산 · 판매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손해액이 너무 적게 산정돼 불법행위자에게 더 큰 이익이 남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불법제품 폐기, 형사처벌 등 다른 조치로 인한 불이익도 침해자에게 부과되지만 권리자 배상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액 산정이 불리하거나 어려우면 저작권법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액 산정 특별규정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불법행위와 직접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저작권법은 이를 완화해 일정한 기준으로 저작권침 해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권침해자가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금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 금액으로 추정한다.
위 사례에 대입해보면 A사는 인형을 3,000원에 1만 개를 팔아 3,000만 원을 벌었고 이 중 이익금액은 1만 개의 수입원가(1개당 1,000원×1만 개)를 뺀 2,000만 원이다.
따라서 권 작가는 A사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근거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인 2,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청구할 수 있다.
B 작가에 대해서도 이모티콘 다운로드 판매액인 100만 원 (1개당 1,000원×1,000개 다운로드)이 이익금액과 같으므로 이를 전부 청구할 수 있다. 만약 SNS 플랫폼에 지급 하는 수수료가 있다면 100만 원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이익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간주’ 조항이 아니라 입증에 의해 복멸될 수 있는 ‘추정’ 조항이므로 상대방이 권작가의 실질 손해액이 이보다 더 작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추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권단(변호사 · 변리사)
·법무법인(유)한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및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지식재산 MBA 겸임교수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전 화 : 02-6255-7788
블로그 : http://danipent.com
이메일 : dank@hanbl.co.kr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20.9월호
출처 :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저작권자ⓒ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