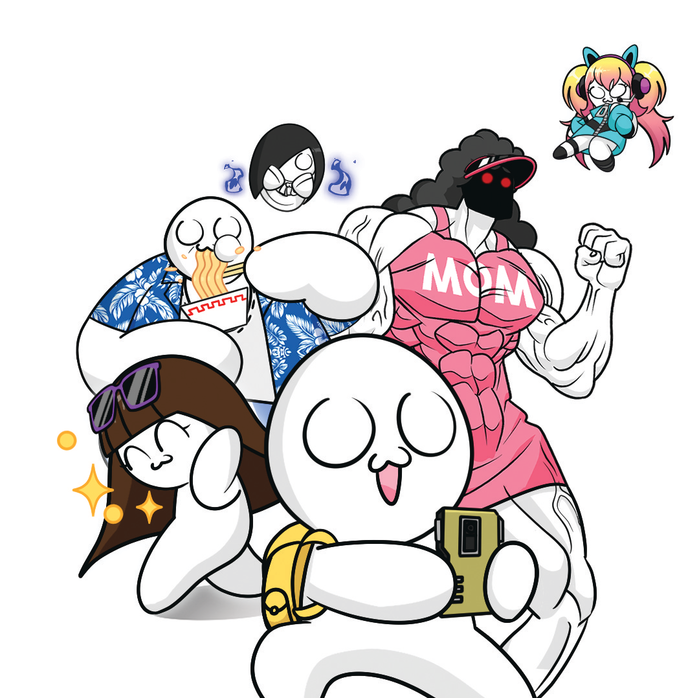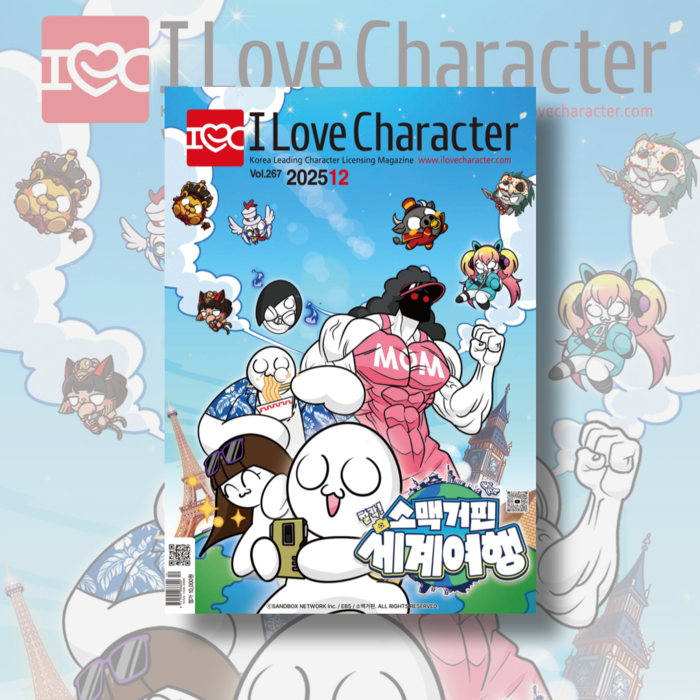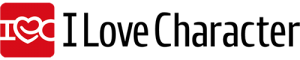사례
A사는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을 출시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 게임은 농작물이 기본적인 캐릭터로 게임 속의 특정한 타일이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되면 함께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해당 타일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목표 타일 수에 이르게 하는 매치3-게임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존에도 다양한 형태의 매치3-게임이 있었지만 팜히어로사가는 과일, 채소, 콩, 태양, 씨앗, 물방울 등을 형상화한 기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면서 방해꾼은 당근을 먹는 토끼, 전투 레벨의 악당은 너구리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사용해 농장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매치3-게임물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팜히어로사가 게임물은 기본 보너스 규칙, 추가 보너스 규칙을 기본으로 히어로 모드, 전투 레벨, 알 모으기 규칙, 특수 칸 규칙, 양동이 규칙, 씨앗과 물방울 규칙, 방해 규칙 등을 단계별로 도입했다. 앞 단계에서 추가된 특수 규칙이 이후 단계에서 추가, 변경되거나 다른 규칙과 조합돼 새로운 난이도를 만들었으며 게임의 전개와 표현 형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게임물은 각 단계별 규칙에 따라 게임 내용을 구현하면서 사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여러 입체감 있는 요소를 결합해 표현했다.
그런데 B사가 2014년 1월 포레스트 매니아라는 게임을 출시했는데 팜히어로사와 같은 매치3-게임 형식을 이용했다. 기본 캐릭터는 농작물 대신 숲속에 사는 동물인 여우, 하마, 곰, 토끼, 개구리 등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사용하고 방해꾼은 토끼 대신 늑대, 악당은 너구리 대신 원시인을 활용했다. 양동이 대신 그루터기를, 씨앗과 물방울 대신 엘프와 버섯을 사용해 전체적인 게임의 형식과 목적, 시나리오 등은 유사하지만 게임물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캐릭터의 표현은 전부 다르게 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B사가 A사 게임물을 표절했다고 하면서 저작권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매치3-게임 형식은 기존에 이미 많으며, 게임의 규칙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이 아니고 게임물의 구성 요소인 캐릭터가 전부 다르게 표현됐으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이 사례는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내용입니다)
해설
1.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표현’이지 콘셉트나 아이디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상의 영역인 아이디어에 독점권인 저작권을 부여하면 창작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돼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산업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수만 개의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고, 저작권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달리 표현된 것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이분하는 취지다.
그런데 게임물에서 게임의 규칙은 이제까지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게임의 규칙의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침해로는 인정하는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였다.
이 사례에서도 1심 및 2심 판결은 양 게임의 규칙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저작물성을 인정 그런데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 요소들 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을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원심(2심)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 요소들의 선택ㆍ배열ㆍ조합에 따른 창작적 개성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게임 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게임 저작물에 있어 제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주요한 구성 요소들(캐릭터 포함)의 표현이 대부분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 요소들을 선택하는 방법, 배열 방법, 구성 요소들의 조합 방식 등이 게임의 규칙과 결합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그러한 표현 ‘형식’에 대해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표현 형식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제작한 제3자는 원 게임물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것이며, 이러한 판단 기준은 게임저작물 분야에서 최초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배치되는 판결로 보이지만,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중 하나인 ‘편집저작물’의 정의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 표현 형식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저작물은 음악, 어문, 미술,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된 복합 저작물이면서 게임물 내 캐릭터들이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부합하도록 제작자가 노력을 기울여 창작한 게임 규칙에 따른 표현 형식에는 저작물성을 인정해 저작권법으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업체들이 게임저작물을 제작할 때 기존에 성공한 게임물의 독창적인 게임 규칙 등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구체적인 구성 요소인 캐릭터들의 모습만 다르게 해 유사한 게임물들을 출시하는 관행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판결은 A사의 게임물의 게임 규칙에 따른 구성 요소들의 배열, 선택, 조합 등 표현 형식이 기존 게임물과 다르게 독창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권단(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유)한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지식재산 MBA 겸임교수
·사단법인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전 화 : 02-6255-7788
블로그 : http://danipent.com
이메일 : dank@hanbl.co.kr
출처 :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2019.07월호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master@ilovecharacter.com)

[저작권자ⓒ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