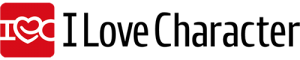사례
해설
또한 그러한 정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정보의 취득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유용성도 인정된다.
B사에 대한 조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B사가 A사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얻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해 C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C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로부터 습득한 관련된 특별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사용하기 위해 고용한 후 비밀을 누설토록 유인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A사가 보유한 비밀정보를 취득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C가 A사에 재직 중일 당시 영업비밀의 유출 내지 이용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했다면 C를 채용한 B사의 담당자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C의 자발적인 퇴사 후 비밀정보의 유출 내지 이용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경우라면 C가 퇴직한 이상 A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어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B사가 C를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A사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A사는 당해 스카우트의 목적 및 수단, 업계에서의 거래관행, 당해 기술인력 거래처의 특수성 또는 비중 등을 고려해 자사의 매출액 감소,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맺는말
업무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 처우 등 근무조건을 고려해 스카우트를 제안한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경쟁사나 거래처의 특수한 영업비밀을 이용하기 위해 스카우트가 적극적으로 이뤄졌거나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조항을 상세히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콘텐츠IP팀 변호사
전화: 02-6952-2652
홈페이지: https://dkl.partners
이메일: yehee.lee@dkl.partners
[저작권자ⓒ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